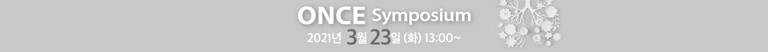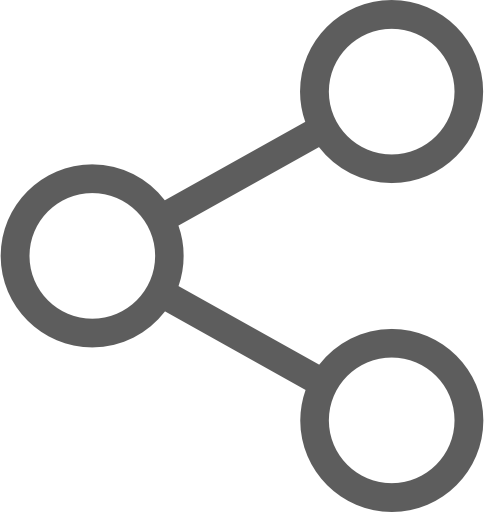다국적 제약사 'Blended Pricing·환급률 차등 적용' 제안
특정 제약사 혜택 논란 걸림돌…"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

최근 몇 년새 임상 현장에서 항암 신약의 존재감이 한층 커지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급여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면역항암제에 더해 항체약물접합체(ADC) 등의 등장으로 여러 암종에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소위 '적응증' 별로 약가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 같은 다국적 제약업계의 의견은 지난 10여년 간 계속됐지만 큰 방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가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까지 적응증을 확장하자 단순히 항암 신약에 국한해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적응증 별 약가 여론전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러 암종에 적응증을 가진 면역항암제나 ADC 등이 국내 임상현장에 도입되면서 같은 약이지만 적응증 별로 약가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적응증별 약가(Indication-based Pricing, IBP)는 의약품의 실제적인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가치기반 약가산정(Value-based Pring, VBP)을 더 세분화 시킨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단일 약가 정책은 최초 적응증을 기반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적응증이 추가할 때마다 급여를 적용 받을 경우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가령, A면역항암제가 최초 폐암에서 적응증을 획득한 뒤 위암, 유방암까지 적응증을 확대해 급여를 추진할 경우 현 제도 상으로는 임상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협상을 통해 기존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적응증을 추가해 급여를 확대하면 할수록 약가를 깎아야 한다.
문제는 주요 면역항암제, ADC 등 여러 암종에 적응증을 가진 치료제가 늘어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급여 적용 요구가 커지면서 현재의 단일 약가 정책으로는 이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적응증은 많은데 급여를 하면 할수록 약가를 깎아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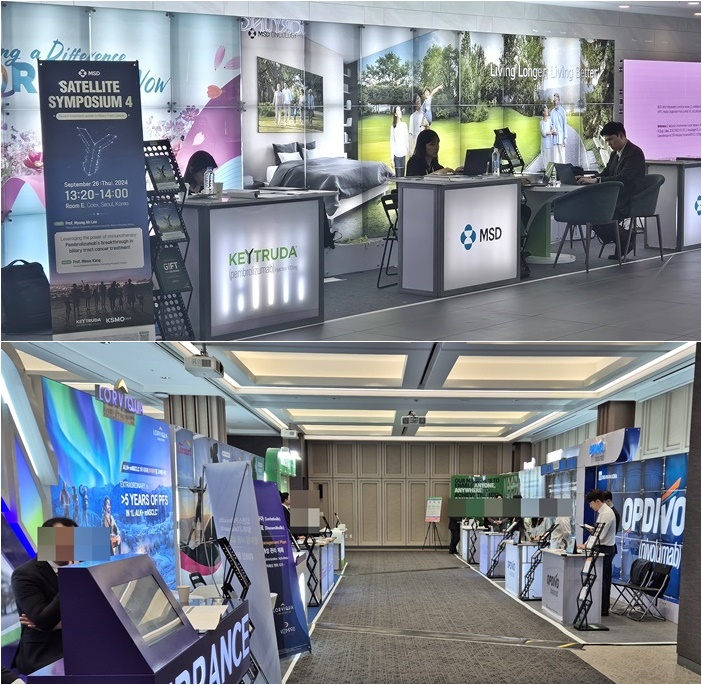
급기야 최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정부에 위험분담제(RSA) 틀 안에서 'Blended Pricing(적응증 가중 평균가)'와 '적응증별 환급률 차등 적용' 방식의 시범사업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Blended Pricing'은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이 대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치료제에 단일 약가를 책정 하되, 적응증별로 예상 사용량과 임상적 가치를 고려해 가중평균가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일 약제에 단일 가격의 합의를 맺는 동시에 급여기준 확대 시 증가되는 환자와 투입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급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Blended Pricing 제도를 우선 도입 한 후 단계적으로 적응증별 환급률 차등 적용 방식으로 위험분담제를 개선하자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이화여대 안정훈 교수(융합보건학과)는 아스트라제네카 후원으로 '다중적응증 약제의 급여 정책' 연구를 최근 발표했다. 사실상 KRPIA를 필두로 한 다국적 제약업계의 제도 도입 의지를 담아낸 것이다.
안정훈 교수는 "Blended Pricing 방식은 국내 급여와 약가제도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Blended Pricing은 법적 계약 단계인 위험분담제에 적용하는 등 실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Blended Pricing을 위험분담제 틀 안에서 적용하면 적응증별 약제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약제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며 "적응증별 사용량에 따라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평가하거나 환급조건을 조정하는 구조와 결합해 정책의 유연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예상 사용량 불확실성 우려
다국적 제약업계의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수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여년 간 끊임없이 도입 목소리가 제기돼 온 만큼 도입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상 빠르게 우선순위로 여기고 시범사업까지 해야 할 만큼 급한 제도도 아니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동시에 다국적 제약사 내에서도 특정 기업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제도화로 이어질 시 특정 제약사에게 도입의 이득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자연스럽게 타 제약사나 국내 제약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 고위공무원을 역임한 한 법무법인 로펌 고문은 "다국적 제약업계에서 끊임없이 제도 도입을 요구했던 사안인데, 정부의 수용 여부를 떠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적응증별 약가제도는 치료제의 사용량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도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를 논의할 경우 이를 예측하고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잘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다시 말해, 현재 위험분담제 적용을 위한 예상 사용량 설정도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Blended Pricing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를 실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뜻이다.
심평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일단 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은 단계다. 치료제 적응증이 늘어날 때마다 매번 가중 평균가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장기적인 과제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