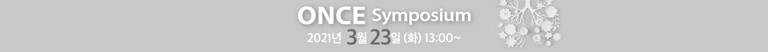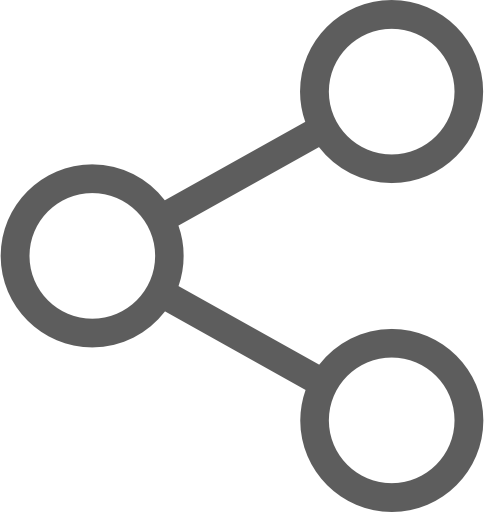가톨릭관동대학교 본과 1학년 정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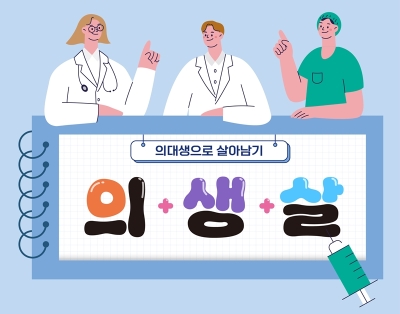
한 달 전,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죽음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갑작스레 혼수상태에 빠지신 뒤 위태롭게 이어지던 숨결은 끝내 멈췄고, 이후 모든 것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삼일장을 치르고, 염을 하고, 화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주한 할머니는 한 줌의 뼛가루로 남아 계셨다.
몸이 불편하셔도 예쁜 옷을 고르고 반짝이는 귀걸이를 즐겨 하시던 분이, 작은 통 하나에 담겨 외할아버지 곁에 안치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스물다섯이 되어서야 비로소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는 듯했다. "할머니, 나 왔어. 조금만 일어나 봐요" 속삭이며 손을 꼭 쥐었던 그 순간, 내 목소리에 맞춰 심박수가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던 모습에 잠시나마 희망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조용히, 그리고 너무 빠르게 사라졌다. 허무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함께 식사하며 "우리 강아지 예쁘다"고 웃으시며 용돈을 쥐여 주시던 그 모습이 선명한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낯설고 아득했다. 살아 있는 동안 쌓은 기억들은 단단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쉽게 흩어질 수 있는지를 마주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밀려왔다. 아,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가.
항상 '뇌출혈로 쓰러지신 할머니를 보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문장을 초등학생 때부터 생활기록부 장래 희망 칸에 써왔던 나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의사를 위한 길을 걷고 있는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을 배우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피하는 법'에 집중한다. 더 빠르게 진단하고, 더 정확하게 치료하며, 위기를 예측하는 법을 익힌다. 나 또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환자의 호흡이 점차 옅어지고, 심전도의 파형이 수평선이 되는 그 침묵의 순간은 그 어떤 책도, 교수님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 어딘가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기술과 지식이 무력해지던 그 순간,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의사는 병을 다루는 법은 배워도, 사람을 이해하는 법은 얼마나 배우고 있는 걸까.
의대생들이 해부학 실습에서 바라본 장기들, 강의실에서 오가는 병명들 사이로는 한 사람의 삶과 기억, 관계가 좀처럼 스며들 틈이 없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병원의 풍경도 마찬가지이다. 환자는 종종 '케이스'로 불리고, 병의 흐름은 수치로 정리된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의 할머니를 떠올리며, 나는 처음으로 그 수치 하나하나에 감정의 결과, 관계의 무게가 실려 있음을 실감했다. 책 속의 질병과 병실 속 한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전해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거리를 기꺼이 좁히려 애쓰는 일, 고통과 이별의 순간을 함께 견디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오래도록 길러야 할 감각일지도 모른다. 무표정한 숫자 뒤에 숨은 마음을 헤아리고, 침묵 속 말해지지 못한 의미를 읽어내는 일…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의사가 평생 익혀야 할 진짜 언어일 것이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는 역할 이전에, 생의 끝자락에 선 누군가의 마음을 끝까지 들여다보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서야 조금씩 배워간다.
겨우 출발선에 선 나는 여전히 서툴고 흔들리는 의대생이지만, 예전보다 조금은 더 여문 마음으로, 누군가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함께할 준비를 하려 한다. 나의 글을 읽는 당신도 어쩌면 가까운 이의 죽음을 마주하고 나처럼 상실감이 클지도 모르겠다.
흔들리고 있는 당신에게, 그 감정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그 시간이 당신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 또 다른 이의 이별을 조금 덜 쓸쓸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